|
|
|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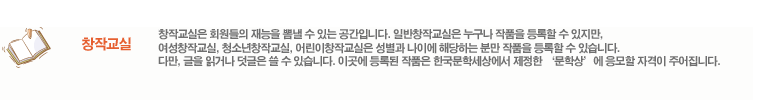
|
|
 ВъЉВё▒ВЮ╝ : 11-10-15 22:51
ВъЉВё▒ВЮ╝ : 11-10-15 22:51
|
ЖИђВЊ┤ВЮ┤ :
ВЮ┤в»ИьЮг
 ВА░ьџї : 11,306
|
ьњђВъјВЌљ вєђвЇў ВъаВъљвдгВ▓ўвЪ╝ вѓ┤ Ж│ЂВЮё в▒Ёв▒Ё вЈївЇў
ВйћВ░ћВ░ћВЮ┤ ВЋёВЮ┤Ж░ђ ВъѕВЌѕВіхвІѕвІц
вѕѕВЮ┤ вѓ┤вдгвЕ┤ вѕѕВѓгвъї Ж░ЂВІю вДївЊцВќ┤
вѓ┤ ВЮ┤вдёВЮё ВаЂВќ┤вєЊвЇў Ж╝гвДѕ ВІаВѓгВўђВДђВџћ
ЖйЃЖИИВЮё вћ░вЮ╝ вѓўвъђьъѕ ьЋЎЖхљ Ж░ѕ вЋљ
вѓ┤ Ж░ђв░ЕвЈё В▒ёВќ┤ вЊцВќ┤ВБ╝ВЌѕВіхвІѕвІц.
ВйДвг╝ВЮ┤ ьњђ вг╝ вљўВќ┤ в╣│в╣│ьЋ┤ВДё
ЖиИ ВЋёВЮ┤ВЮў ВєљВѕўЖ▒┤ВЮ┤
ьЃюЖи╣ЖИ░В▓ўвЪ╝ в╣Џвѓў в│┤ВўђВіхвІѕвІц.
ьѓц ВъЉВЮђ вѓўвг┤Ж░ђ ВДђвХЋВю╝вАю ВўгвЮ╝Ж░ѕ вЋї
ЖиИ ВЋёВЮ┤вЈё вХђВЕЇ В╗цВАїВіхвІѕвІц.
вѓўвъђьъѕ Вќ┤Ж╣евЦ╝ вДъВХћвЇў ЖиИвѓаВЮ┤ в░ђвацвѓўвЊ»
ЖиИ ВЋёВЮ┤вЈё ВаљВаљ вњцвАювДї Ж░ћВіхвІѕвІц
ВЌ░ВюавЦ╝ вг╗віћ ьјИВДђЖ░ђ ьЋю ВъЦ ьЋю ВъЦ ВЊ░ВЌг
вДцВЮ╝вДцВЮ╝ ЖиИ ВЋаВЮў ВДЉВЮё ВёюВё▒Ж▒░ваИВіхвІѕвІц.
Вќ┤вЉЉьЋ┤ВДё Ж│евфЕЖИИВЮё ьЎђвАю вЈїВЋёВёю Вўг вЋї
ЖиИ ВЋёВЮ┤ВЮў ВХћВќх в░░ВЮИ ВєљВѕўЖ▒┤вЈё ьЃюВЏаВіхвІѕвІц.
Ж░Ћвг╝ВЌљ ВІ▒ЖиИвЪгВџ┤ в░ћвъїВЮ┤ ВЮ╝ вЋї
вѓ┤Ж▓ївЈё ьњІьњІьЋю ВЃѕ В╣юЖхгЖ░ђ ВЃЮЖ▓╝ВіхвІѕвІц
ВДЉВю╝вАю вЇ░вацвІц ВБ╝віћ вѓўвъђьЋю Вќ┤Ж╣еЖ░ђ ВъѕВќ┤
вЇћвіћ ВЎИвАГВДђ ВЋіВЋўВіхвІѕвІц.
ЖиИ ВЋаВЎђ Ж▒ивЇў ЖИИвАю вІцВаЋьЋўЖ▓ї Ж▒иЖ│а ВъѕВЮё вЋї
ВќИвЇЋ ВюёВЌљВёю ЖиИ ВЋаВЮў вЁИвъФВєївдгЖ░ђ вЊцвацВЎћВіхвІѕвІц
Вќ╝Ж░ёВЮ┤ВЮў В▓ФВѓгвъЉВЮ┤ ЖиИвд╝ВъљвЦ╝ вДївЊцвЕ░
вѓ┤ ЖиђВЌљВёю вЈЎвЈЎЖ▒░ваИВіхвІѕвІц.
ЖиИ ВЋёВЮ┤віћ ЖиИваЄЖ▓ї ве╝в░юВ╣ўВЌљВёю
віў вѓ┤ вњцвЦ╝ Ж▒иЖ│а ВъѕВЌѕВіхвІѕвІц.
ьЋўВДђвДї вЈїВЋёв│┤ЖИ░ВЌћ вёѕвг┤ вЕђВќ┤ в│┤ВўђВіхвІѕвІц.
ВДџ ьЃюВџ░віћ вЃёВЃѕ Ж░ЎВЮђ ЖиИвдгВџ┤ в░ћвъїВЮ┤ вХѕвЕ┤
вѓўвіћ ЖиИ Вќ╝Ж░ёВЮ┤вЦ╝ ЖИ░ВќхьЋЕвІѕвІц.
ВДђЖИѕ ЖиИ ВЋавіћ Вќ┤віљ ВЮ┤ВЮў Ж░ђВі┤ВЌљВёю
Вйћ вг╗ВЮђ ВєљВѕўЖ▒┤ВЮ┤ вљўВќ┤ ьјёвЪГЖ▒░вдгЖ│а ВъѕВЮёЖ╣їВџћ
ьЋўвіўЖ│╝ вЋЁ ВѓгВЮ┤ВЌљ ЖйЃ в╣ёЖ░ђ вѓ┤вдгвЇў вѓа,
ВўцвіўВЮђ ЖИ░ьЃђвЦ╝ ьЅЂЖИ░вЕ░ вХђвЦ┤вЇў
Вќ╝Ж░ёВЮ┤ВЮў вЁИвъўЖ░ђ ВъљЖЙИвДї
ВєїВіг ВєїВіг вЊцвац ВўхвІѕвІц
|
|
|
|
|
|

